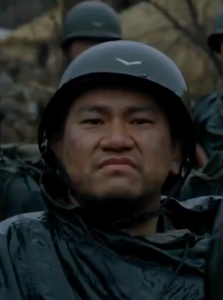그 주변에는 눈이 아름답게 내려왔다. 오대수는 미도의 빨간 잠바 털 사이에 눈이 끼고, 뭉치고 녹는 걸 조용히 봤다.
“아저씨 왜 이래,” 미도가 얘기 했다, “많이 걱정 되었는데.”
오대수는 미도가 참 반가웠다. 서로 안으면서 대수의 입은 서서히 환한 웃음으로 펼처젓다. 날씨가 추웠지만 그때 대수는 매우 따듯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디야?” 미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
대수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뭔가 이상해서 다시 닫았다. 그때 대수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걸 깨달았다; 자기 혀에 느낌이 없었다. 사실 그는 혀가 아예 없었다. 놀라서 대수는 미도에서 떨어지고 손가락 하나를 자기 입에 집어넜다. 진짜로 대수의 혀가 있었던 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아저씨 괜찮아?”
말을 못 하고 대수는 입을 벌리고 사람 같지 아닌 소리를 넷다. 충격 받은체 오대수는 미도를 멍하게 보면서 주저앉았다.
“아저씨!”
놀란 체 미도는 대수한테 가까이 왔다.
“괜찮아?” 미도가 걱정된 표정으로 대수를 바라봤다. 대수는 꼼짝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었다.
“왜 그래, 말해봐!”
오대수는 고개를 내리면서 옆으로 절래절래 흔들었다. 그다음 한숨을 쉬고 미도랑 눈을 마주친 다음에 입을 열었다. 미도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 전에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대수는 다시 입을 다물고 바닥을 째려 봤다.
“어떡해…” 미도는 말을 못 끝냈다. “아저씨…”
오대수눈 어떻게 자기 혀가 사라졌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사실 이 숲속 가운데에 어떻게 왔는지도 기억이 없었다. 깊이 생각을 해볼려고 하면 머리 속에서만 맴돌 뿐 어떤 단서가 생각이 날듯 말듯 할 뿐이었다.

앞을 다시 봤을 때 미도랑 눈을 마주쳤다. 대수는 일어슨 다음에 자기 옷에서 눈을 털고 뒤를 돌아봤다. 거기는 검은 의자 두개가 있었고 그 의자들 쪽에서 온 발자국들이 눈에 찍혀 있었다. 대수는 그 발자국들을 따라 의자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미도가 눈에 앉아서 조용이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대수는 멈추고 뒤돌아 미도가 눈물 닦으면서 일어나는 걸 봤다. 깊이 쌓인 눈을 헤치며 그녀는 대수 쪽으로 어색하게 거러오길 시작했다. 눈을 못 맞추고 미도는 대수의 팔을 잡고 같이 발자국들을 따라 걸어갔다.
의자들에 도착을 하고 난 후 대수는 또 다른 발자국들을 찾았다. 그 둘은 조용히 바닥을 바라보다가 미도가 침묵을 깨트렸다.
“이거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대답을 못 하고 대수는 발자국들을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조용해졌다. 심지어 바람도 서희와 함께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 숨 쉬기가 너무 힘들게 됐다. 세상은 지현 주위에 응축 된 것처럼 느꼈다. 지현은 혼자서 쭈그려 앉아 놀이터 모래 위에서 가족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모와 집에서 행복하게 함께 사는 두 아이의 그림이었다. 잠시 후, 지현은 모든 것을 털어 내고 모래에 그린 사라졌다.
모든 것이 잠시 동안 조용해졌다. 심지어 바람도 서희와 함께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 숨 쉬기가 너무 힘들게 됐다. 세상은 지현 주위에 응축 된 것처럼 느꼈다. 지현은 혼자서 쭈그려 앉아 놀이터 모래 위에서 가족을 그리기 시작했다. 부모와 집에서 행복하게 함께 사는 두 아이의 그림이었다. 잠시 후, 지현은 모든 것을 털어 내고 모래에 그린 사라졌다.

 어떻게 이만큼 인기가 많을 수 있는지 우연이 아직도 이해 못 했다. 두 달 후에 카톡에서 캐릭터 스티커도 생기고, 석 달 후 이대와 홍대 길거리에서 핸드폰 케이스도 팔고, 가을이 왔을 때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고생들, 마트 옆에서 과일을 파는 아줌마들, 가끔은 남학생들도 다 웹툰을 보고 있었다. 시즌 1이 끝나기 전에 유명한 감독과 시즌 2는 드라마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마침내 오늘 자 신문에 발표가 되었다.
어떻게 이만큼 인기가 많을 수 있는지 우연이 아직도 이해 못 했다. 두 달 후에 카톡에서 캐릭터 스티커도 생기고, 석 달 후 이대와 홍대 길거리에서 핸드폰 케이스도 팔고, 가을이 왔을 때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고생들, 마트 옆에서 과일을 파는 아줌마들, 가끔은 남학생들도 다 웹툰을 보고 있었다. 시즌 1이 끝나기 전에 유명한 감독과 시즌 2는 드라마로 만들기로 했었는데 마침내 오늘 자 신문에 발표가 되었다. 옛 생각에 잠겨서 우연이는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을 거의 놓칠 뻔 했다. 급히 내려
옛 생각에 잠겨서 우연이는 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을 거의 놓칠 뻔 했다. 급히 내려